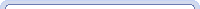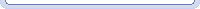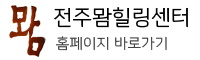세사르 바예호
2017.11.02 08:48
같은 이야기
-세사르 바예호
나는 신이
아픈 날 태어났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나쁘다는 걸
모두들 압니다. 그렇지만
그 시작이나 끝을 모르지요
여쨋든, 나는 신이
아픈 날 태어났습니다.
나의 형이상학적
공기 속에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 공기를 마셔서는 안 됩니다
불꽃으로 말했던
침묵이 갇힌 곳.
나는 신이
아픈 날 태어났습니다
형제여, 들어보세요. 잘 들어봐요.
좋습니다. 1월을 두고
12월만 가져가면
안 됩니다.
나는 신이
아픈 날 태어났다니까요.
모두들 압니다.
내가 살아 있음을.
내가 먹고 있음을…… 그러나,
캄캄한 관에서 나오는 無味한
나의 시 속에서
사막의 불가사의인 스핑크스를 휘감는
해묵은 바람이
왜 우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두들 아는 데… 그러나 빛이
폐병환자라는 건 모릅니다
어둠이 통통하다는 것도…
신비의 세계가 그들의 종착점이라는 것도……
그 신비의 세계는 구성지게
노래하는 곱사등이이고, 정오가 죽음의 경계선을
지나가는 길 멀리서도 알려준다는 것을 모릅니다.
나는 신이
아픈 날 태어났습니다
아주 아픈
신에게 대놓고 불평을 하는 이 시인은 누굴까. 세사르 바예호다. 지금은 페루의 국민시인이라는 칭송을 들으며 고액권 지폐에 등장하는 인물이 됐지만, 살아있을 때 바예호는 매우 불운한 사람이었다.

신은 그에게 천재적인 재능을 주었지만, 평화로운 삶을 주지는 않았다. 그는 평생을 시대와 환경과 병마와 싸워야 했다.
바예호는 1882년 페루의 가난한 광산촌 산티아고 데 추코에서 태어났다. 그는 원주민 인디오와 메스티조(유럽인과 인디오의 혼혈) 사이에서 태어났다. 유럽인의 피를 4분의 1정도 가지고 태어난 그는 평생 정체성과도 싸워야 했다.
13살에 중등교육을 받기 위해 고향을 떠난 그는 트루히요 대학과 산 마르코스 대학에서 스페인 낭만주의 시를 공부한다. 1919년에는 틈틈히 썼던 시를 모아 첫 시집 『검은 전령』을 출간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수도 리마에서 교편을 잡았던 그는 잠시 고향을 방문했다가 방화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다. 그를 못마땅하게 여긴 마을 권력자의 모함이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문우들의 탄원으로 3개월 감옥살이 끝에 풀려난 그는 환멸의 페루를 떠나 프랑스 파리로 이주한다. 수감 생활 중 정리한 시들을 모아 두 번째 시집 『트릴세』를 출간했다.
파리에서 생활하던 그는 마르크스 주의에 경도된다. 급기야 소련 방문 중 공산당 기관지에 글을 수록한 것이 문제가 되어 추방된다. 잠시 스페인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는 이념 문제로 여러 차례 고초를 겪는다. 파리에 다시 돌아온 후 소설 『텅스텐』, 희곡 『지친 돌』 등을 발표하면서 활발한 작품활동을 한다. 스페인 내전에도 큰 관심을 보여 내전 중 수 차례 스페인을 다녀오기도 했다.
결국 그의 발목을 잡은 건 폐결핵이었다. 바예호는 1938년 폐결핵이 악화되어 파리에서 사망한다. 사망 후 『스페인이여! 나에게서 이 잔을 거두어 다오』등 유고시집이 출간됐다.

바예호의 시는 당시 유럽문단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독특한 표현법과 이미지, 과거와 미래를 초월하는 시간성, 안데스문화와 유럽문화를 넘나드는 다중 정체성, 구어체를 활용한 언어기법 등은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을 만큼 뛰어나면서도 독특했다.
바예호 시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각난 이미지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이미지 덩어리가 된다는 것이다. 「인간은 슬퍼하고 기침하는 존재」라는 시를 보자.
인간은 슬퍼하고 기침하는 존재.
그러나, 뜨거운 가슴에 들뜨는 존재.
(중략)
인간이 때로 생각에 잠겨
울고 싶어하며, 자신을 하나의 물건처럼
쉽사리 내팽개치고,
훌륭한 목수도 되고, 땀 흘리고, 죽이고
그러고도 노래하고, 밥 먹고, 단추 채운다는 것을
어렵잖게 이해한다고 할 때……
인간이 진정
하나의 동물이기는 하나, 고개를 돌릴 때
그의 슬픔이 내 뇌리에 박힌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인간이 가진 물건, 변소,
절망, 자신의 잔인한 하루를 마감하면서,
그 하루를 지우는 존재임을 생각해볼 때……
내가 사랑함을 알고,
사랑하기에 미워하는데도,
인간은 내게 무관심하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할 때……
인간의 모든 서류를 살펴볼 때,
아주 조그맣게 태어났음을 증명하는 서류까지
안경을 써가며 볼 때……
손짓을 하자 내게
온다.
나는 감동에 겨워 그를 얼싸안는다.
어쩌겠는가? 그저 감동, 감동에 겨울 뿐……
놀랍지 않은가. 이 무작위로 쏟아낸 듯한 파편적인 단어들이 결국 한 데 모여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지 않는가.
바예호는 잡초처럼 끈질기고 강한 삶의 모습들을 시로 구현하길 좋아했다.
그에게 인간의 삶은 아름다움과 추함이 공존하는 무대 같은 것이었다.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기뻐하면서, 때로는 저주하고 때로는 감동하면서 사는 것이 바예호가 생각한 인생이었다.
이 작품은 인간의 만화경 같은 생을 잘 표현하고 있다. 슬프고, 기침하고, 들뜨고, 땀 흘리고, 단추를 채우고, 죽이고, 노래하고, 밥 먹고, 감동하고 하는 것이 생이다.
사실 인생은 그렇다. 바예호가 제대로 간파한 것이다. 눈물을 흘리다가는 웃고, 웃다가는 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인생 아닐까. 일하고 싸우고 기뻐하고 분노하고 기다리고 감탄하고 것이 결국 인생 아닐까. ‘인생 뭐 있어, 그냥 사는 거지’ 이런 외마디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

바예호는 또 죽음에 많이 천착했다. 그는 소년시절 어머니와 형, 누나의 죽음을 목도한다.
「나의 형 미겔에게」라는 시에서 바예호는 “형! 너무 늦게까지 숨어 있으면 안돼. / 알았지? 엄마가 걱정하실 수 있잖아”라고 말한다. 죽은 형을 숨바꼭질 놀이를 하다 숨어버린 것으로 표현한 부분은 가슴이 뭉클하다. 물론 바예호도 안다. 형은 영원히 숨어 있을 것이라는 걸.
그리고 바예호는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 특히 고향 안데스의 원주민들의 삶을 많이 노래했다.
「원주민에게 바치는 노래」에서 바예호는 이렇게 노래한다.
“음악과 불꽃 사이에서 아코디언이 연주된다./ 구멍가게 주인은 바람에 대고 / 큰 소리로 외쳐댄다. 최고다, 최고!” / 떠다니는 아름답고 우아한 불꽃, / 농부가 하늘의 별 세계에 심은 / 싯누런 황금 밀알들.”
바예호의 시는 절망과 슬픔, 혹은 자학을 넘어서 어떤 미학을 만들어낸다. 그는 자신이 살아냈던 모든 모순들을 모아서 하나의 ‘정신’을 만들어낸다.
같은 남미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이지만 바예호보다 훨씬 호사스럽게 살았던 파블로 네루다는 이런 시를 남겼다. 제목은 ‘바예호에게 바치는 송가’다.
“하늘과 땅 / 삶과 죽음에서 / 두 번이나 버림받은 / 내 형제여”
| 허연 (시인, 매일경제 문화전문기자)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 | 세사르 바예호 | 물님 | 2017.11.02 | 5435 |
| 352 | 흰구름 | 물님 | 2017.10.24 | 5444 |
| 351 | 서성인다 - 박노해 | 물님 | 2017.09.19 | 5436 |
| 350 | 여행은 혼자 떠나라 - 박 노해 | 물님 | 2017.08.01 | 5443 |
| 349 | 운명 - 도종환 | 물님 | 2017.05.21 | 5434 |
| 348 | 진정한 여행 | 물님 | 2017.02.24 | 6098 |
| 347 | 시바타도요의 시 | 물님 | 2017.01.27 | 5963 |
| 346 | My heart leaps up when I behold | 따발총 | 2016.12.25 | 5423 |
| 345 | 거룩한 바보처럼 | 물님 | 2016.12.22 | 6072 |
| 344 | 조문(弔問) | 물님 | 2016.11.24 | 5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