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을 만들며...
2011.05.20 06:35
댓글 5
-
구인회
2011.05.23 18:57
-
구인회
2011.05.23 18:59
-
하늘
2011.05.24 05:12
고맙습니다.
씨알(구인회)님! ~.~*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주시고 나눠주시는 그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씨알님 가정의 아이들도 많이 컸지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 아주 오래 전에
불재에서 아장아장 걸었던 님의 아이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언제 불재에 놀러 가면 또 만날 수 있을 테지요.
이제 조금은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몇 년 동안 아이들 셋을 대학에 보내려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불재의 식구들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저의 집 아이들은 엄마가 만들어주는 음식 가운데...
'김밥 & 육개장'은 한국 식당의 것보다 더 맛있다고 합니다.
그 칭찬에 춤을 추며 열심히 만들어준답니다.
씨알님, 5월도 내내 행복하시고 강녕하소서!
...ㅎㅏ늘.
-
하늘꽃
2011.05.27 13:55
*그 칭찬에 춤을 추며 열심히 만들어준답니다.*
눈에 선합니다 아름다운모습이.....
음악과 글로 제가 잘 쉬게 되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이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인것을...
오늘도 하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릅답게 만 보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신 하늘님을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
하늘
2011.06.04 11:39
고맙습니다.
하늘꽃님! ~.~*
잘 계시지요?
언제나 멋지고 아름다우십니다.
6월도 내내 평안하소서!
...ㅎㅏ늘.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714 | 직업 [1] | 삼산 | 2011.06.30 | 3374 |
| 713 | 보스턴에서 '할렐루야 권사님'과 함께... [4] | 하늘 | 2011.06.25 | 3313 |
| 712 | 나의 풀이, 푸리, 프리(Free) [4] | 하늘 | 2011.06.07 | 4043 |
| 711 |
하하하 미술관에 초대합니다
[2] | 승리 | 2011.06.05 | 3060 |
| 710 |
당신은 내게 꼭 필요한 사람
[2] | 하늘 | 2011.06.04 | 2962 |
| 709 | 우연히 들렀는데 많은... | 봄꽃 | 2011.05.22 | 3033 |
| 708 | 선생님께서는 얼굴 없... | 아침햇살 | 2011.05.20 | 3242 |
| » | 김밥을 만들며... [5] | 하늘 | 2011.05.20 | 3366 |
| 706 | 개나리와 이씨 아저씨 [3] | 하늘 | 2011.05.11 | 3057 |
| 705 | 봄에는 우주의 기운이... | 도도 | 2011.05.07 | 346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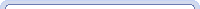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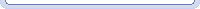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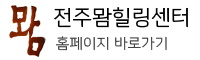

사랑의 단맛이 가득한 김밥
먹어보고시퍼라^^*
김밥을 만들며...
따뜻하고 행복한 하늘님 가족
가족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전해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