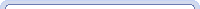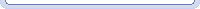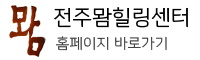자살에 대하여
2012.02.15 23:41
자살에 대하여 - 김홍한목사
조선말 선비 황현이 나라 망함에 비통하여 자살을 하면서 남긴 글이 유명하다.
“가을 등불아래 책을 덮고 옛일을 생각하니, 지식인이 된다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로다. … 500년 선비를 키운 나라에서 나라가 망하는 날에 죽는 사람이 하나 없다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느냐?”
황현이라는 조선 선비의 고결한 죽음 앞에 숙연하지 않을 수 없다.
낭만적인 죽음으로는 현해탄에 몸을 던진 윤심덕의 죽음이다. 1926년 윤심덕과 김우진이 현해탄 연락선에서 동반투신자살 했다. 윤심덕은 최초의 국비유학생, 최초의 여성 성악가, 대중가수, 아름다운 미모, 짖은 화장등 유행의 첨단에 있던 여인이었다. 그녀를 연모한 숱한 남성들, 그중에는 사나이의 뜨거운 눈물을 한없이 흘린 이들이 있는가 하면 짝사랑의 괴로움이 병이되어 죽은이도 있다.
그가 작사하여 부른 <사의 찬미>
“광막한 황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려 왔느냐 이래도 한세상 저래도 한평생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그녀는 그렇게 노랫말 대로 죽음을 택했다.
역사의 획을 그은 죽음도 있다. 1970년 11월 시대의 천민 전태일이 분신했다. 그의 죽음이 자살이라 하여 교회는 그의 장례를 거부했지만 또 다른 면에서 교회는 그를 “작은 예수”라 하면서 그의 죽음에 더할 수 없는 의미를 부여하고 그의 죽음이 거룩한 죽음임을 선포하였다.
전태일의 뒤를 이은 또 다른 수많은 작은 예수들이 민중의 해방과 조국의 통일, 민주 쟁취를 위해서 죽음을 택했다.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이는 “죽음의 굿판을 집어 치워라” 라고 혹평하기도 하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는 그들에게 너무 많은 빚을 졌다.
황당한 사건도 있다. 1987년 8월, 오대양이라는 종교집단의 집단 자살 사건이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오대양 용인공장천정에서 32구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그들 자신은 어쩌면 순교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무지와 광기의 황당한 죽음이었을 것이다.
1996년 1월, 가수 김광석이 자살했다. 당시 33세의 젊은 나이였다. 1000회 넘는 라이브공연을 했던 그다. 지금까지도 그의 노래를 사랑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내가 아는 어떤이는 “미치도록 김광석의 노래가 좋다”고 토로한다.
2003년 8월 현대그룹의 정몽헌 회장이 투신했다. 모든 직장인들과 모든 자영업자들의 꿈인 재벌그룹 회장인 그가 자살했다. 그의 죽음은 사람들이 그토록 동경하는 엄청난 부가 행복이나 삶의 보람과는 별개라는 것을 보여준다. 자본주의라 이룬 허상의 탑을 보는 듯했다.
2008년 10월, 귀엽고 발랄한 여배우 최진실이 죽음을 택했다. 취중의 어떤이는 화가난 듯 외친다.
“돈있지, 예쁘지, 뭇 남성들의 사랑을 받지, 그런 년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이냐?”
2009년 5월, 노무현대통령이 서거했다. 도무지 권력과는 거리가 멀 것 같은 이가 권력의 정점에 있었다. 용케도 임기는 마쳤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도 감당키 힘들었던 모양이다. 대통령 이었지만 누가 보아도 서민이었기에 서민들의 사랑을 듬뿍받고 돌아갔다.
우리들은 대부분 죽음에 대해서는 수동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때로는 죽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위가 있는데 그것이 자살이다.
자살이 죄악시 된 것은 기독교의 영향이지만 사실 자살을 죄악시하기에는 자살의 이유가 너무 다양하다. 때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을 때에 선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때로는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동정의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다. 석가는 제자 박카리가 심한 병으로 자살을 생각하자 반대하지 않았다.
16세기 영국의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에서 말하기를 “유토피아 에서는 안락사를 허용, 권장한다. 그러나 자살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런데 나는 안락사와 자살의 구별에 모호함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의 제목을 <자살에 대하여>라고 잡았지만 진짜 내가 하고픈 이야기는 반대의 이야기다. “오래 살려는 것…” 나는 그것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21세기, 한국의 젊은이들은 죽음을 계획하고 늙은이들은 죽지 않으려고 안달한다.
매일매일 죽음의 신과 대화하고 흥정하는 젊은이들의 절망은 한때 나도 경험한 바다.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어 위로하고 힘을 주고 싶지만 마땅히 할 말이 없어 그것이 안타깝다. 그러나 좀 더 오래 살고자, 죽음은 자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오로지 관심이란 “건강”과 “웰빙”이 전부인 늙은이들을 보면 연민이 아니라 경멸의 마음이 든다. 종교인이라는 이들도 혹 죽을 병에서 회생하면 그것을 무한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긴다.
나는 오래전부터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해 왔다. 나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 단순한 객기가 아니라 심사숙고한 결과이다.
건강검진 결과 죽을병에 걸렸다는 진단이 나오면 그때부터 나의 생은 크게 비틀어질 것이다. 아무리 죽음을 순종함으로 받으려 한다고 늘 다짐하지만 마음의 동요는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치료할 돈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하려 애쓴다면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도 심각한 어려움에 빠진다. 그리고 치료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수명의 연장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삶이 아니라 인위적인 삶이라는 생각이다.
건강검진을 거부하는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내가 어느 정도 살만큼 살았기 때문이다. 내 나이가 53세다.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의 평균수명이 40세다. 일제강점기에는 50세다. 그분들에 비한다면 이미 평균수명을 넘었다.
죽음이 임박한 내가 정신이 멀쩡하다면 어찌할까? 굶어 죽어야 겠다. 굶어 죽는 것이 어려울까? 그렇지 않다. 죽을 때가 되지 않은 사람이 억지로 굶는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힘들겠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사람은 먹는 것이 굶는 것 보다 더 힘들다. 몸이 이미 음식을 거부하니 굶는 것이 더 쉽다. 굶으면서 몸이 작아진다. 몸이 작아지는 만큼 맘이 커진다. 굶고 굶어서 가벼워진 몸으로 하늘에 오를 것이다. 새는 하늘을 날기 위해서 뼛속까지 비우지 않는가?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라면 그 보다 더 심각한 사회문제는 죽지 않으려는 것이다. 사회문제도 되지만 종교적인 문제이다. 죽지않으려는 것은 심각한 불신앙이다. “생명”이라는 것이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죽음”이라는 것은 “그만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니 죽지 않으려 하는 것도 심각한 불신앙이 아닐 수 없다.
성현들 중에는 자살한 이가 없다. 또한 오래 살려고 애쓴 이도 없다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281 | 누가복음21장19절 말씀 | 도도 | 2012.04.01 | 11541 |
| 280 | 보물 [1] | 물님 | 2012.03.24 | 11799 |
| 279 | 남을 이기려는 사람은 | 물님 | 2012.03.22 | 11549 |
| 278 | 오늘 청도 바람은 - 배명식목사 | 물님 | 2012.03.20 | 11797 |
| 277 |
가온의 편지 / 궤 도
[4] | 가온 | 2012.03.06 | 11674 |
| 276 | 수단을 목표로? - 장길섭 | 물님 | 2012.03.03 | 11768 |
| 275 | 영적 친교 | 물님 | 2012.02.17 | 11546 |
| 274 | 선교의 개척자 배위량 부인 - 스토리텔링 [2] | 물님 | 2012.02.16 | 11516 |
| » | 자살에 대하여 | 물님 | 2012.02.15 | 13371 |
| 272 | 자녀 죽음 방치한 종교인 '목사' 안수 안받았다" | 물님 | 2012.02.15 | 12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