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이슬털이
2009.05.10 08:23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어버이의 날’을 앞두고 분야별로 예술가의 어머니 한 명씩을 선정해 시상하는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상’.
올해 선정된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 여섯 명 가운데 한 명이 소설가 이순원의 어머니 김남숙 씨다.
‘2009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상’ 시상식이 열린 지난 4일, 소설가 이순원과 그의 어머니 김남숙 씨를 신라호텔에서 만났다.
강릉에서 오랜만에 올라오신 어머니 ‘비싼 밥’ 드시게 한다고 딸과 사위가 마련했다는 이 자리에선 소설가 이순원도 그저 오남매 중 ‘셋째’일 따름이다.
 |
| 신라호텔에서 만난 두 모자(母子)는 굳이 소개를 안 해도 모자지간임을 대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눈매며 입매가 꼭 닮아있었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이성규> |
“내가 잘 해서 탔나. 다 셋째 지가 잘하고, 며느리가 내조를 잘 해서 탄 거지”.
수상 소감부터 묻자 김 씨는 며느리에게 공을 돌리며 겸손하게 말문을 열었다. 가정이 화목하고, 집안이 평안해야 좋은 글도 나올 수 있다는 것.
어머니 자랑은 다음 차례인 아들의 몫이다.
“제가 쓴 글의 절반은 어머니로부터, 반에 반은 제가 살던 고향 마을로부터 영감을 얻은 거죠. 어머니가 가장 큰 기여를 한 셈이네요(웃음)”.
그에게 동인문학상의 영광을 안겨준 소설 ‘수색, 어머니 가슴속으로 흐르는 무늬’도 어머니를 소재로 쓴 작품이라고 했다.
문단의 중진으로 나이 쉰을 넘긴 그가 지금까지 써온 글만 해도 벌써 수백, 수천 개에 달할 터. 그런데 그 절반이 어머니로부터 나온 것이라니 문득 어릴 적 두 모자(母子)의 모습이 궁금해졌다.
중학생 이순원은 학교 다니는 것을 몹시도 싫어하는 학생이었다. 집에서 학교까지 통학시간만 꼬박 3시간이 걸리는 데다 불편한 산길을 매일같이 오가야 했으니 그럴 법도 했다.
그런 아들이 안쓰러웠던 어머니는 어느 날 아침 마지못해 문을 나서던 아들의 가방을 받아들고 앞서 집을 나섰다. 산길에 이르자 어머니는 가방을 다시 아들에게 넘겨주고, 그때부터는 두 발과 지게 작대기를 이용해 아들이 가야 할 산길의 이슬을 털어내기 시작했다.
“어떤 날에는 어머니가 새벽에 먼저 나서서 이슬을 털어내기도 했는데, 어머니는 ‘어미의 정성을 생각해서 딴 길로 새지 말라’고 무언으로 이르고 있었다”고 이 씨는 말했다.
이 씨는 어릴 적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것을 글로 옮겼고(그의 첫 산문집 ‘은빛낚시’ 중 ‘어머니의 이슬털이’), 지난 4일 여든의 노모가 ‘장한 어머니상’을 받던 날 어머니와 청중들 앞에서 그 글을 낭송했다.
 |
|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상’ 시상식이 열린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무대에서 소설가 이순원이 어머니를 옆에 두고 그의 산문 ‘어머니의 이슬털이’를 낭송하고 있다.<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전소향> |
“학교 가는 길도 고단했지만 실은 중학생이 되면서 내가 문명으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게 더 고통스러웠죠. 그래서 더 학교 가기가 싫었어. 다른 애들도 나랑 별반 다를 바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학교 다니는 게 왜 그토록 싫었느냐고 되묻자 이 씨가 당시의 속내를 털어놨다.
어릴 적 그가 살던 마을은 대관령 아래 산골짜기. 그곳은 마을의 최고 연장자인 ‘촌장’이 있고, 그가 대학생이 되어서야 비로소 전기가 들어왔다는 그런 마을이다. 머리가 굵어지면서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자라지 못한 자신의 처지가 친구들과 비교돼 학교 가기가 더욱 싫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내 표정이 밝아진 그는 “그 때 그 자연 속에서 살았던 것이 지금의 내겐 정말 큰 재산”이라며, 당시 등잔불 밑에서 책을 읽고, 어머니는 옆에서 바느질을 하셨다던 그림 같은 이야기를 줄지어 쏟아냈다.
그의 얘기를 듣고있자니 소설가 이순원을 만들어낸 어머니, 그리고 그의 고향 마을이 마치 내 어머니, 내 고향의 이야기를 듣는 듯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그렇게 인터뷰 내내 그가 쏟아낸 이야기들은 그 자체가 하나의 짧은 산문이 되고도 남을 법했다.
그러면서 처음에 들었던 의문, ‘예술가들을 길러낸 어머니에겐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에 대한 대답도 자연스럽게 얻어낼 수 있었다.
끝없이 털어내고 털어내도 아들의 바짓가랑이가 젖을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아들보다 앞장서 이슬털이를 마다않던 어머니. 어머니의 평범한 행동 속에 깃든 그런 진한 ‘정성’이 아마도 예술가들의 영혼엔 특별함으로 자리잡았을 것이다.
역시나 그의 마지막 멘트가 가슴을 울린다.
“돌아보니 그때 어머니가 털어주신 이슬로 큰 강 하나가 이뤄져 있습니다”.
■ 이순원의 산문 ‘어머니의 이슬털이’ 전문
(※ 아래 내용은 이순원 씨가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상' 시상식에서 낭독한 글의 전문으로 이순원 씨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중학교 때 나는 학교 다니기가 싫었다. 대관령 아랫마을에서 강릉 시내 중학교까지 아침저녁으로 30리 길을 걸어다녀야 했다.
학교로 가는 길 중간에 산에 올라가 아무 산소가에나 가방을 놓고 앉아 멀리 대관령을 바라보다가 점심때가 되면 그곳에서 도시락을 까먹기도 했다. 어떤 날은 혼자서 그러고, 어떤 날은 같은 마을의 친구를 꾀어서 그러기도 했다.
나중엔 점점 대담해져서 아예 집에서부터 학교를 가지 않는 날도 있었다.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어제는 비가 와서, 그제는 눈이 와서, 하는 식으로 핑계를 댔다.
그러던 오월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나는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왜 안 가느냐고 물어 공부도 재미가 없고, 학교 가는 것도 재미가 없다고 말했다. 어린 아들이 그러니 어머니도 한숨이 나왔을 것이다.
“그래도 얼른 교복을 갈아입어라.”
“학교 안 간다니까.”
“안 가면?”
“그냥 이러다가 농사지을 거라구.”
“농사는 뭐 아무나 짓는다더냐? 에미가 신작로까지 데려다줄 테니까 얼른 교복 갈아입어.”
몇 번 옥신각신하다가 마지못해 교복을 갈아입었다.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오자 어머니가 마당에 지게작대기를 들고 서 계셨다. 나는 어머니가 그걸로 말을 안 듣는 나를 때리려고 그러는 줄 알았다. 그 모습에 놀라 잠시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섰다.
“얼른 가자.”
하루 일곱 시간씩 공부하던 시절이었다. 가방 무게가 만만치 않았다. 어머니는 한 손엔 가방을 들고 또 한 손엔 지게작대기를 들고 나보다 앞서 마당을 나섰다. 나는 어머니가 아들이 학교에 가기 싫어하니 중간에 다른 길로 샐까봐 신작로까지 데려다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신작로로 나가는 산길에 이르러 어머니가 다시 나에게 가방을 주었다.
“너는 뒤따라 오너라.”
거기서부터는 온통 이슬밭길이었다. 사람 하나 겨우 다닐 좁은 산길에 풀잎이 우거져 아침이면 풀잎마다 이슬방울이 조록조록 매달려 있었다.
어머니는 나에게 가방을 넘겨준 다음 두 발과 지게작대기를 이용해 아들이 가야 할 산길의 이슬을 털어내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몸뻬 자락이 아침 이슬에 흥건히 젖었다. 어머니는 발로 이슬을 털고, 지게작대기로 이슬을 털었다.
그런다고 뒤따라가는 아들의 교복 바지가 안 젖는 것도 아니었다. 신작로까지 15분이면 넘을 산길을 30분도 더 걸려 넘었다. 어머니의 옷도, 그 뒤를 따라간 아들의 옷도 흠뻑 젖었다. 어머니는 고무신을 신고 나는 검정 운동화를 신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물에 빠졌다가 나온 것처럼 땟국물이 질컥질컥 발목으로 올라왔다. 어머니와 아들은 무릎에서 발끝까지 옷과 신발을 흠뻑 적신 다음에야 신작로에 닿았다.
“앞으로는 매일 털어주마. 그러니 이 길로 곧장 학교로 가. 중간에 다른 데로 새지 말고.”
그 자리에서 울지는 않았지만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 나 혼자 갈 테니까.”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어머니가 매일 이슬을 털어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어떤 날 어머니는 가끔 아들 학교길의 이슬을 털어주었다. 또 새벽처럼 일어나 산길의 이슬을 털어놓고 올 때도 있었다. 어머니도 어머니가 아무리 먼저 그 길의 이슬을 털어내도 집에서 신작로까지 산길을 가다 보면 아들의 옷과 신발이 어머니의 것처럼 젖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어머니는 아들이 다른 길로 새지 않길 기도하듯 산길의 이슬을 털어주었다.
후에도 어머니는 아들이 이런저런 일로 방황할 때마다 마음의 이슬밭길을 털어주었다. 어른이 된 다음에야 아들은 예전에 어머니가 털어주신 이슬밭길을 떠올린다. 이곳까지 내가 걸어온 길이 그랬다. 그때 어머니가 털어준 이슬이 모여 아들이 걸어온 길 뒤에 푸른 강 하나가 흐르고 있는 것이다.
■ 이순원 프로필
소설가 이순원은 1985년 강원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소'가 당선, 문단에 나왔다. `수색, 어머니 가슴속으로 흐르는 무늬'로 동인문학상, `은비령'으로 현대문학상, `그대 정동진에 가면'으로 한무숙문학상, 2002년 제1회 이효석문학상을 수상했다.
소설집으로는 ‘그 여름의 꽃게’ ‘얼굴’ ‘수색, 그 물빛 무늬’ ‘말을 찾아서’ 등이 있고, 장편소설 ‘우리들의 석기시대’ ‘압구정동엔 비상구가 없다’ ‘에덴에 그를 보낸다’ ‘미혼에게 바친다’ ‘아들과 함께 걷는 길’ 등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댓글 2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414 | 존재가 춤을 추는 춤테라피에 초대합니다. | 결정 (빛) | 2009.06.03 | 4718 |
| 413 | 유월 초하루에 | 물님 | 2009.06.02 | 2951 |
| 412 | 멍텅구리 [1] [1] | 물님 | 2009.06.01 | 4176 |
| 411 | "노제"를 마치고 -김명곤 [1] [1] | 물님 | 2009.05.31 | 5039 |
| 410 | 노무현 - 그의 인권을 지켜주었어야 했다. | 물님 | 2009.05.29 | 3005 |
| 409 |
우리의 아이들과 마사이 연인들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1] | 춤꾼 | 2009.05.25 | 2960 |
| 408 | 오후 만나뵙게 되어 ... | 소원 | 2009.05.25 | 2952 |
| 407 | 인사드립니다. | 소원 | 2009.05.25 | 3059 |
| 406 | 감사합니다. | 결정 (빛) | 2009.05.15 | 3200 |
| » | 어머니의 이슬털이 [2] | 물님 | 2009.05.10 | 484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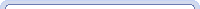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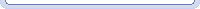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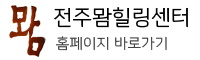

우리의 모든 어머니들은 우리에게 다른 길이겠지만 이슬털이를 해주셨을텐데 왜 보지 못했을까요?
소중함! 감사함을 다시금 볼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