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포에서
2008.06.24 18:53
입춘이 지난 철새들은
근질거리는 날개짓으로
시베리아의 꿈을 털고 있다. <하늘꽃은 여기서 감동받아 얼어버렸다>
배들은 모두 떠나가고
물그림자만 길게 남아서
옛 이름을 지키고 있는 웅포
내 소년기의 영혼의 성감대를
열어젖히던 덕양정의 갈대 소리가
오늘은 더욱 푸근하다.
세상은 변한 건 없다.
새롭게 모양 낸 강둑을 따라
여전히 하루에 두 번씩 오고 가는
조수의 흐름처럼
나도 때맞춰 너에게
오고 갈 뿐.
이제는 피도 눈물도 썩고 썩어서
어떤 대책도 없는 황토빛으로
흘러가는 금강
아침 노을보다는
더욱 황홀한 석양 끝에 서서
나는 또 기다리고 있다.
네가 질 때까지.
물
근질거리는 날개짓으로
시베리아의 꿈을 털고 있다. <하늘꽃은 여기서 감동받아 얼어버렸다>
배들은 모두 떠나가고
물그림자만 길게 남아서
옛 이름을 지키고 있는 웅포
내 소년기의 영혼의 성감대를
열어젖히던 덕양정의 갈대 소리가
오늘은 더욱 푸근하다.
세상은 변한 건 없다.
새롭게 모양 낸 강둑을 따라
여전히 하루에 두 번씩 오고 가는
조수의 흐름처럼
나도 때맞춰 너에게
오고 갈 뿐.
이제는 피도 눈물도 썩고 썩어서
어떤 대책도 없는 황토빛으로
흘러가는 금강
아침 노을보다는
더욱 황홀한 석양 끝에 서서
나는 또 기다리고 있다.
네가 질 때까지.
물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303 |
아직 가지 않은 길
[2] | 구인회 | 2010.02.05 | 4027 |
| 302 | 문수암(내 손버릇을 고쳐놓은시) [3] | 하늘꽃 | 2008.08.15 | 4029 |
| » | 웅포에서 [1] | 하늘꽃 | 2008.06.24 | 4031 |
| 300 | 서정주, 「푸르른 날」 | 물님 | 2012.09.04 | 4033 |
| 299 | 포도주님독백 [7] | 하늘꽃 | 2008.08.21 | 4035 |
| 298 | 거짓말을 타전하다 [1] [2] | 물님 | 2012.04.24 | 4037 |
| 297 | 물님의 시 - 화순 운주사 | 운영자 | 2007.08.19 | 4042 |
| 296 | 바다 [3] | 이상호 | 2008.09.08 | 4042 |
| 295 | 김세형,'등신' | 물님 | 2012.03.12 | 4043 |
| 294 |
하늘꽃
[3] | 하늘꽃 | 2008.10.23 | 404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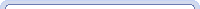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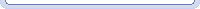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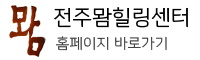

금강
철새
사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