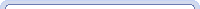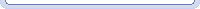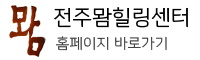프랑스의 철학자 쟝 그르니에의 '섬'.
2021.04.15 04:26
* 오늘, 시간이 멈추는 한 순간이 있기를 바라며 -
프랑스의 철학자 쟝 그르니에의 '섬'.
“찰나의 한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나 자신보다도 더 깊숙이 자리 잡은 그 존재의 내면으로 또 다시 달려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바다 위를 하염없이 떠도는 꽃들이여, 거의 잊어버리고 있을 때 쯤에야 다시 나타나는 꽃들이여, 해조들이여, 시체들이여, 잠든 갈매기들이여, 뱃머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그대들이여, 아, 나의 행운의 섬들이여,! 아침의 충격들이여, 저녁의 희망들이여, 내가 또한 그대들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으려나? 오직 그대들만이 나를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구나. 그대들 속에서만 나는 나를 알아볼 수 있었으니, 티 없는 거울이여, 빛없는 하늘이여, 대상없는 사랑이여(...)
그 순간(오직 그 순간에만), 내 발과 땅, 내 눈의 빛의 끈끈한 결합을 통해서 나는 나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지중해 연안의 온 바닷가에서 팔레르모, 라벨로, 라귀즈, 아말피, 알제, 알렉산드리아, 파트라스, 이스탄불, 스미른, 바로셀로나의 모든 테라스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이면서 말하고 있다.
‘그렇다.’ 라고, 그 감각적인 세계가 한갓 겉으로만 보이는 얇은 천 조각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밤이면 우리가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우리의 고통이 헛되이 말끔히 쓸어버리려고 애쓰는 변화무쌍한 악몽의 베일일 뿐이라고 해도, 그 때문에 가장 먼저 고통을 받는 어떤 사람들이 그 베일을 다시 만들고 그 겉모습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우주적인 삶을 다시 도약시키려 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다.
만일 그러한 일상적 삶에서의 열정이 없다면, 우주적 삶은 어느 곳에서인가 바짝 마르게 될 것이다. 마치 어느 황량한 벌판에서 그 줄기가 영영 사라져 버리는 샘물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말한다. 나도 내 자신에게 말한다. 추구해야 할 경력이라든지, 창조해야할 작품이라든가에 대해서......
결국 어떤 목표를, 하나의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그러나 이와 같은 간구懇求의 목소리가 나의 마음속 깊은 그 무엇에 다다르지는 못하고 있다.
앞에서 말한 그 목표를 어느 순간들에는 이루어 보기도 했다. 그리고 다시 한 번(거의 언제나 실망하기 마련인 희망이긴 하지만) 내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으리라고 막연히 생각하기도 한다.“
장 그르니에의 <섬> 중 <행운의 섬>에 일부분.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공자에게 불러준 광접여의 노래 | 물님 | 2021.11.02 | 4086 |
| 117 | 조선 지식인의 내면 읽기; 정민, | 물님 | 2021.05.10 | 729 |
| 116 | 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 - 추강냉화 | 물님 | 2021.05.06 | 711 |
| » | 프랑스의 철학자 쟝 그르니에의 '섬'. | 물님 | 2021.04.15 | 755 |
| 114 | 얼의 거울 | 물님 | 2021.03.13 | 731 |
| 113 | 인생의 지혜 | 물님 | 2021.03.03 | 773 |
| 112 | 쇼펜하우어 - 소품과 보유 | 물님 | 2021.03.03 | 860 |
| 111 | 김시습의 문집 <매월당 집> 4권 부록 | 물님 | 2021.02.10 | 775 |
| 110 |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의 편력시대> | 물님 | 2021.01.30 | 709 |
| 109 | 시작 | 물님 | 2021.01.23 | 633 |
| 108 | 자만심 | 물님 | 2021.01.18 | 7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