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달래 교회에 보내는 편지 5. 꺼지지 않는 불의 신전
2022.02.11 11:41
치대에는 수능 때문에 11월만 되면 괜히 기분이 으슬으슬한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몇 년간은 그랬는데 아무래도 누구에게나 쉬운 기억은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도 치과의사 국가고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하던 기억이 새록새록 합니다.
국가고시 공부하던 시절 기지개를 하면서 독서실 천장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줄줄이 늘어선 형광등 불빛이 밤낮으로 꺼지지도 않는구나.’ 장작처럼 기다란 저 하얀 불빛 조각들을 보고 있으니 느헤미야의 신전 불을 위한 장작을 바치라는 대목이 떠오르더군요. 신전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진리를 상징한다고 했었지요. 저 불도 시험 기간만 되면 꺼질 줄을 모르니 치의학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겠구나 싶었습니다. 다들 열나게 자기를 태워 공부하고 있으니 저도 제 몫을 다 하리라 의지를 다졌습니다. 물론 그날도 일찍 귀가해 단잠을 자기는 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땐 꺼지지 않는 저 불빛이 참 괴로웠습니다. 누군가는 나보다 한 시간 더 공부하고 그래서 그만큼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에 침실 불을 꺼도 머릿속은 켜져 있었습니다. 만약 고등학교 시절에 독서실 전등을 신전의 불과 같은 의미로 생각했다면 경험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되돌아봅니다. 물론 국가고시는 수능과는 다릅니다. 모두가 함께 합격하고 싶은 시험이니까요. 하지만, 만약에라도 그렇게 생각했다면, 혼자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학창시절 학습된 줄세우기가 의식속에 박제되었다는 증거를 종종 발견합니다. 명문대 생이면 그저 멋지다고 하고, 직업만 보고 좋은 남편감이라며 소개팅이 줄줄이 들어오고. 심지어는 점수 때문에 의대를 못간 친구들이, 또는 지방대에 있다는 사실이 동기들을 위축되게 합니다. 반대로 다른 과들이 모여있는 대외활동에 가도 치대에서 왔다고 하면 대단하다고 합니다. 미국만 가도 치과의사는 그렇게 대단한 직종이 아닌데 말이예요. 그러니, 이러한 생각들의 첫단추인 고등학교 독서실 불빛의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였다면 어땟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구가 타올라 태양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651 | 진달래 교회에 보내는 편지 9. 야곱의 팥죽 (부제: 원수를 사랑하라) | 산성 | 2022.02.26 | 13329 |
| 650 | 진달래교회에 보내는 편지 8. 채찍, 죽창과 종 (2) | 산성 | 2022.02.19 | 13351 |
| 649 | 진달래교회에 보내는 편지 7. 채찍, 죽창과 종 (1) | 산성 | 2022.02.19 | 13283 |
| 648 | 아침 기도 [1] | 물님 | 2022.02.17 | 13794 |
| 647 | 진달래 교회에 보내는 편지 6. 하나님의 나라 [1] | 산성 | 2022.02.13 | 13596 |
| » | 진달래 교회에 보내는 편지 5. 꺼지지 않는 불의 신전 [1] | 산성 | 2022.02.11 | 13309 |
| 645 | 진달래 교회에 보내는 편지 4. 기름 없는 등불 [2] | 산성 | 2022.02.07 | 13357 |
| 644 | 진달래 교회에 보내는 편지 3. 초인 [2] | 산성 | 2022.02.07 | 13452 |
| 643 | 진달래 교회에 보내는 편지 2. 시작 | 산성 | 2022.02.07 | 13314 |
| 642 | 진달래 교회에 보내는 편지 1. 서문 [2] | 산성 | 2022.02.07 | 1333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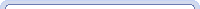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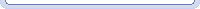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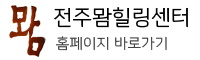

지구가 타올라 태양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