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저녁의 시
2010.11.18 06:53
<가을 저녁의 시>
김춘수
누가 죽어 가나 보다.
차마 감을 수 없는 눈
반만 뜬 채
이 저녁
누가 죽어 가는가 보다.
살을 저미는 이 세상 외롬 속에서
물같이 흘러간 그 나날 속에서
오직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애 터지게 부르면서 살아온
그 누가 죽어 가는가 보다.
풀과 나무 그리고 산과 언덕
온 누리 위에 스며 번진
가을의 저 슬픈 눈을 보아라.
정녕코 오늘 저녁은
비길 수 없이 정한 목숨이 하나
어디로 물같이 흘러가 버리는가 보다.
김춘수
누가 죽어 가나 보다.
차마 감을 수 없는 눈
반만 뜬 채
이 저녁
누가 죽어 가는가 보다.
살을 저미는 이 세상 외롬 속에서
물같이 흘러간 그 나날 속에서
오직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애 터지게 부르면서 살아온
그 누가 죽어 가는가 보다.
풀과 나무 그리고 산과 언덕
온 누리 위에 스며 번진
가을의 저 슬픈 눈을 보아라.
정녕코 오늘 저녁은
비길 수 없이 정한 목숨이 하나
어디로 물같이 흘러가 버리는가 보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 | 가을 저녁의 시 [1] | 물님 | 2010.11.18 | 5746 |
| 222 | 연애시집 - 김용택 [2] | 물님 | 2010.10.29 | 5806 |
| 221 | 가을은 아프다 / 신 영 [2] | 구인회 | 2010.09.11 | 5494 |
| 220 | 길 [2] | 요새 | 2010.09.09 | 5987 |
| 219 | 그대에게 /이병창 [2] | 하늘 | 2010.09.08 | 5997 |
| 218 | 구름의 노래 [1] | 요새 | 2010.07.28 | 5736 |
| 217 | 초혼 [1] | 요새 | 2010.07.28 | 6000 |
| 216 |
나는 배웠다 / 샤를르 드 푸코
[1] | 구인회 | 2010.07.27 | 5799 |
| 215 | 물.1 [3] | 요새 | 2010.07.22 | 5487 |
| 214 | 바닷가에서 | 요새 | 2010.07.21 | 589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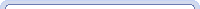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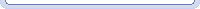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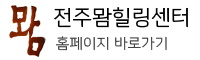

온도를 가늠 할 수 없는 불꽃, 노랑으로 살라지는 은행잎, 그 명치의 통증이 가슴 가운데로 ......그 슬픔이 그랬군요.
살을 저미는 이 세상 외롬 속에서 오직 한 사람의 이름을 애터지게 부르며 살아온 그 누가 죽어 가는, 그것 이었군요.
이 세상 외롬 속 그 한 가운데
절명으로 부르는 깊은 가을 저녁을 만납니다.
그리고 비길 수 없이 정한..... 목숨 하나,
어디로 물 같이 흘러가 버립니다. 흘러가......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슬픈 눈,
그마저도 풍경 마냥 바람이 입니다.
참 깊은 가을, 시인을, 그 가슴을 한 精人을 그립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