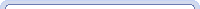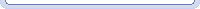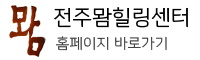박항률 "영혼의 소리새"
2011.07.20 13:21



























|
박항률의 "영혼의 소리새"
"인간의 삶은 무수히 꺾여진 다각형 태어남도 죽음도 사랑과 증오까지도 인간들이 가두어놓은 생각으로 허무맹랑한 역사를 지속할 때 모든 것은 잊혀져야 한다.....,, 심지어 그 자유자재한 시간마저 제쳐두고서 보다 더 깊은 곳으로 흘러야 한다....,, 박항률의 '비존재의 삶' 中"
비가 대지를 적십니다. 비도 말이 없고 대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비는 내리고 대지는 비를 받아드릴 뿐, 다 받아드리고 더 이상 받아드릴 힘이 부족할 때 비는 대지 위를 흘러갑니다. 비는 왜 안 받아주냐고 따지거나 묻지를 않아요. 대지 역시 그만 내리라고 조르거나 성질내지 않습니다. 비는 내리고 대지는 품에 안을 만큼 하염 없이 품고만 있을 뿐...
이렇게 우주의 섭리는 물은 물대로 대지는 대지대로 흐트러짐 없이 제각기 흘러가게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수많은 생각과 욕망으로 폭포수처럼 흘러가다가도 별안간 불안에 휩싸입니다. 특히 오늘날 지독한 경쟁의 소용돌이와 뜨거움 속에서 살아남고자 몸부림치는 현대인의 모습은 물질세계를 두리번거리는 낡은 기계나 또 다른 물질이지 사람의 꼴이 아닙니다. 저마다 급변하는 물질의 지형 속에서 맹목적으로 달려가다 보니 다른 사람과 같이 사는 것도 불편해졌고 홀로 살지도 못합니다. 이와 같이 물질은 인간의 정신을 돌덩이처럼 딱딱하게하고 삶의 주된 가치의 핵심마저 물질의 가치로 대체해 버립니다. 결국 현대를 사는 사람은 존재의 거룩함을 잊고 스스로를 소외의 극한 지대로 추방시켜버렸으며, 소유된 물질은 그걸 소지한 인간을 소유하게 되는 비극의 고리에서 삶과 죽음의 시소를 탑니다.
현대인이 열린 무덤에서 혼자 고요하게 있는 법, 혼을 고결하게 만드는 법을 잃어버리고 쾌락과 물질세계를 향하여 앞다퉈 달려 갈 때, 불쑥 한 시인이 나타나 해맑은 물감으로 시 한편을 써내려 갑니다. 시인은 시를 비우면서 현대인을 향하여 그냥 '고요하라' 합니다. 연거푸 '고요하라, 침묵하라, 잠잠하라' 는 그의 그림의 소리가 새볔녁의 새소리로, 어느 때는 풀벌레 울음, 때로는 천둥소리로...! 그러다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고 하는 인면조의 울음을 웁니다. 마침내 울음은 새를 낳고 한마리 새가 되어 인간성을 가로막고 있는 물질의 패러다임을 넘어 신비와 의미의 지대로 푸드득 날아 오릅니다. 그 세계는 꿈과 상상, 전설과 신화, 신비와 의미의 세계 물고기의 형상을 한 한 마리의 새, 꿈 속의 비조 飛鳥 말의 형상을 한 전설 속의 비마 飛馬가 되고 가장 구슬프고 예쁜 울음을 우는 천상의 인면조 人面鳥, 평화의 세발 까마귀로 되살아나 허공을 납니다. 게다가 그의 영혼의 마디 마디 울려퍼지는 소리새 아이적 뛰놀던 옛동산, 누이와 함께 놀던 기쁨과 슬픔의 언덕 가득 오래된 침묵으로 울려퍼지는 한 화가의 애절한 소리 인간의 내면에서 출발하여 그림 곳곳에 펼쳐진 고요와 의미의 세계.
켄버스 가득 그림이 시, 시가 그림인 신개념의 조형언어를 펼친 작가는 시인 박항률 화가(우리나라, 1950 ~ ) 이제 예순을 넘긴 박항률 화가는 경북 김천 출신으로 우여곡절 끝에 그림을 시작하여 기발한 작품세계를 열었으며, 현 세종대 교수, 이 분의 이력이나 미술계에 차지하는 비중도 대단하지만, 이런 것보다 유난히 관심을 끄는 것은 화폭 가득 마치 선 禪이나 도 道, 마치 화두를 던지는듯 한 그의 그림입니다. "무애여래여만월 無碍如來如滿月" 아무 것도 걸리지 않는 여래와 같이 님의 달빛을 받아 마치 화가가 구도자의 길을 가는 선승이나 도인이기라도 하는 듯 시공간에 소년과 소녀의 상념과 표정을 통해서 공空과 무아無我와 연기緣起를 그려내는 화가의 기막힌 솜씨에 탄복하면서도 어쩌다가 이 화가는 젊었을때부터 노인내 냄새가 나는 성불한 그림을 그리게 되었을까 가여운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뼈속까지 사무치는 엄동설한 嚴冬雪寒을 겪지 않고서 봄날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이 화가에게도 말 못할 사연이나 고비가 있었던 건 아닐까? 그림 속에 자주 등장하는 깨달음을 찾아 가는 화엄의 길, 선재동자 같은 까까머리 소년, 숲 속에 정령이나 비구니 여승, 색동옷 곱게 차려 입은 소녀와 소녀 곁에 언제나 수호천사처럼 목소리 대신 말해주고 있는 새, 새 한마리, 아린 추억 한토막은 귓전에 맴돌고...! 어릴적 박항률은 경제학자였던 부친의 반대로 그림 그리는 일을 할 수 없었다는 데, 고교 입학시험에서 떨어지고 고향 김천으로 내려가 농고 미술반에서 그림 그리기 시작한 것이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됩니다. 특히 그 시절에 만난 중3짜리 사촌누이와의 인연과 추억은 그에게 공부와 그림 말고도 존재에 대한 물음을 던져준 것 같습니다. 척추 장애를 앓고 있었던 사촌누이는 중3이지만 발육상태가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밖에 안 되었어요. 하지만 박항률은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문학 소녀였던 이 누이에게서 오히려 위로 받고 시도 배우게 되지요. 그 누이를 엎고 산이며 들과 강으로 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그는 회상합니다. 그러던 사촌누이가 그만 고 2때 갑자기 죽고맙니다. 너무 고단한 병이었고 세상 뜨는 순간까지 너무 힘들었다고...!
무슨 운명의 장난 같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었던 자기 자신과 아무 죄없는 착한 사촌누이의 질병과 괴롭고도 갑작스런 죽음은 마치 싯달타가 생로병사의 고통을 보고 왕궁을 나선 것처럼 당시 예민한 그에게 무시무시한 충격과 비애를 안겨준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충격을 받으면 말을 잃어버린다고 했던가요. 그의 그림은 몹시 충격 받은자의 슬픔, 그 슬픔의 대상에 대한 그리움과 연민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당시 까까머리 학생은 교복 대신 가사나 수행복을 입은 모습으로 대체되고 공부 대신 누이와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사촌누이는 이승을 떠났지만 그는 차마 누이를 보낼 수 없었고 결국은 그림 속에서 그녀를 부활시켜 냅니다. 새는 그녀의 아바타로 한 번도 날아보지도 못했고, 한 번도 꽃피우지 못했던 누이의 짧은 생, 그 삶이 너무나 슬프고 아퍼서 떠나 보내지 못하고 이 세상에 머무는 그녀를 보여줍니다. 날아가지 못한 새가 누이이고 꽃피우지 못한 누이가 그림 속의 새. 불 속에 뛰어들어 불에 타 죽고 또 그 불에서 부활하는 아미타불의 극락정토에 산다는 전설 속의 새 칼라빈카(kalavinka)를 되살려내, 그 불멸의 새가 무소유지 無所有地 고요한 곳에서 불멸不滅의 생을 추구하고 그녀 곁에서 가여운 영혼을 달래주게 합니다.
그 전설 속의 새를 불러내면서까지 그녀를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한 작가, 그는 슬픈 운명 속에 스러진 누이를 보고 인고의 세월을 겪고 그립고 아쉬움이 커지는 만큼 그의 작품 역시 깊어져 인간의 상상력과 관념으로 정의내릴 수 없는 오직 그만의 신비스럽고 지고지순한 예술세계를 꽃피웁니다. 그 세계에 존재하는 까까머리 소년과 사촌누이 그리고 한 마리의 새 다시 말하면 박항률 화가의 그림 세계는 본인의 작품이자 늘 그 곁에 새처럼 영감과 한 영혼으로 자리잡은 누이와 소꼽장난 하듯이 함께 만든 작품. 그 영혼이 꿈꾸고 그 영혼이 꽃피웠을 때 그 누이도 그 안에서 꿈꾸고 그 영혼도 그림 속에서 활짝 꽃 피웁니다.
"죽음을 초연한 사촌 누이의 티없이 맑은 눈동자는 곱사등 넘어로 영민한 광채를 띄우고 척박하기만 했던 나의 마음 밭에 단비를 내려주곤 했다. 어쩌면 내 그림 속에 빈번히 등장하는 까까머리 소년의 모습은 아직도 내 마음 속을 차가운 정적으로 응시하고 있는 그녀 눈망울에 비친 내 자신일는지 모른다 - 詩 '사촌누이'
결국 그와 그의 누이가 한 영혼이 되어 꽃피웠을 때 작가는 더이상 그 영혼을 가두거나 붙잡으려 하지 않고 가슴의 새장에서 풀어줍니다. 그 자신도 크고 그림도 훌쩍 커버렸을 때 웅크리고 붙잡고 있을 것이란 아무 것도 없었던 겁니다. 일체가 진공眞空인데 진공에서 생명을 보니 다 부질 없고 한이 없는 것 색色은 공空이 되고 또 무無가 되어 본디 온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인과연기 因果緣起 이실법계 理實法界 눈 뜨니 이 세상이 한 없이 장엄한 천국이요 법계 法界, 미안함과 그리움으로 그를 짓눌렀던 원망과 부정과 미움도 비워지고 존재의 끄트머리에서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이제 어린새가 인면조가 되어 훠이 훠이 날아오릅니다. 그도 날고 그의 누이도 천공을 납니다. 새를 타고 날고 또 새와 같이 한 영혼이 되어 자유로이 돌아갑니다.
"나에게 그림이란 언제나 바깥세상으로 내닫는 문을 굳게 잠그고 지루하게 가면놀이에 몰입하게 되는 독백의 방이다. 그림은 화려한 치장을 벗겨내고 삶의 원형으로 환원되기 위한 도구일 따름이며, 질척거리는 세상, 살이 주변을 배회하다 뜻하지 않게 들여다 본 꿈 같은 삶의 초상일 뿐이다."
혼돈의 세월, 어둡고 쓸쓸한 독백의 방에서 꿈같은 삶의 초상을 그리다가 청정한 명상과 무한한 진공 속으로 들어간 선인禪人 영혼 속에서 꺼져가는 불씨 하나를 찾아 찰나 속에 영원을 영원 속에 찰나를 보고, 공空의 화폭에 禪을 담아낸 빅항률 화가
한 영혼의 극락왕생을 꿈꾸는 간절한 염원 속에서 부활한 인면조, 설산에서 천년을 사는데 죽을 때가 되면 불 주위를 돌며 악기를 연주하고 기쁨의 춤을 추다가, 불속에 뛰어 들어 타죽는다는 무량수불 無量壽佛 정토의 칼라빈카(kalavinka), 그 죽음의 끝은 한 줌의 재가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이요 그 재에서 부활하여 다시금 칼라빈카로 사는 소리새의 울음이 이 순간 누이의 맑은 목소리 되어 켄버스 가득 울려퍼집니다.
그림 그리는 시인의 노래 한자락 띄웁니다.
아름다운 삶의 순간 순간이 시간 속에 묻혀가는 것을 느끼며 나는 안타까움에 가슴을 졸인다. 더 사랑해야지 더 크게 울고 웃고 괴로워해야지 이 귀한 삶의 시간들이 그냥 소홀히 지나쳐가지 않도록
'sial
|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132 |
안부를 전해 주신 님
| 구인회 | 2011.09.28 | 5791 |
| 131 |
이외수. 2
| 구인회 | 2011.07.30 | 6016 |
| 130 |
이외수. 1
| 구인회 | 2011.07.30 | 6206 |
| 129 | "꽃이 된" 김종학 | 구인회 | 2011.07.28 | 5884 |
| 128 |
철수판화 "나 별세중이다"
| 구인회 | 2011.07.21 | 6062 |
| » | 박항률 "영혼의 소리새" | 구인회 | 2011.07.20 | 6213 |
| 126 |
먹물의 번짐 속…한국화가 이소 문연남 세번째 개인전
[1] | 구인회 | 2011.07.18 | 5898 |
| 125 |
좋다
[2] | 하늘꽃 | 2011.07.16 | 5887 |